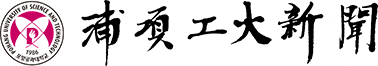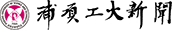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강렬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즉각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 1만여 명으로 시작된 집회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규모가 커졌다.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는 200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모이며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집회 현장은 차분하면서도 색다른 에너지가 가득했다.
집회 현장, 촛불 대신 손에 들린 것은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전통적인 저항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돋보였다. 촛불 대신 시민들의 손에 들린 것은 K-팝 아이돌의 응원봉이었다. △엑소 △트와이스 △뉴진스 △라이즈 등 다양한 그룹의 응원봉이 겨울밤 광장을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였다.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 또한 민중가요 대신 K-팝 곡들이 주를 이뤘다. 시민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개사해 함께 부르며 탄핵안 가결의 기쁨을 나눴고,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탄핵해야지’로 바꿔 부르며 저항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촛불 집회는 민중가요와 전통적인 저항 노래들로 엄숙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집회는 K-팝과 대중문화가 주요한 소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유쾌하고 창의적인 저항의 장으로 변모했다. 이에 성균관대 구정우(사회학과) 교수는 “K-POP의 상징인 응원봉은 국내외 젊은 층의 공감을 끌어내기 쉬운 도구”라며 “응원봉을 드는 행위는 시위 현장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흐름과 함께 집회 현장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세대교체를 맞이한 집회 현장의 새로운 열기
젊은 세대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젊은 층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과 달리 20대와 30대가 대거 집회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 응원봉을 든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들 응원봉을 들고 모이자’라는 메시지가 퍼지며 참여를 독려했다. 더 나아가 K-팝 응원봉을 집회 도구로 개조한 ‘탄핵봉’을 만드는 방법도 공유됐다.
집회 현장은 단순히 분노와 저항을 표출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았다. 시민들은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깃발과 소품들을 활용해 집회에 개성을 더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족저근막염 연합 △고양이 발바닥 연구회 등 독특한 단체명이 적힌 깃발이 나부꼈고,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가 집에서 나와야겠냐’와 같은 문구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나아가 추운 날씨에 ‘선결제 릴레이’ 또한 이어졌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과 유명 연예인들은 인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와 음료류를 일정 금액만큼 선결제하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탰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역 일대에서는 핫팩, 마스크 등 시민들이 추운 밤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집회 문화, 새로운 대한민국 광장 민주주의의 현주소
이처럼 세대를 초월한 집회의 양상은 모두의 소통 및 화합의 장으로서, 또 하나의 ‘뉴노멀’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나에게 소중한 건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 아래 하나로 모아진 참가자들의 마음은, 이름도, 사는 곳도 모두 다른 이들 사이에서 강한 연대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정적이고 획일화된 집회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만의 개성을 더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오늘날은, 또 한 걸음 발전한 대한민국 광장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이런 집회 분위기에 영국 BBC,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집회 참가자들은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시위하는 모습이었다’, ‘집회는 댄스 파티를 연상케 했다’라며 주목했다.
1919년 3.1 운동부터 2016년 대규모 촛불 집회, 그리고 오늘날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노와 저항의 발걸음이 모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 평화로운 저항, 그것이 우리 민족만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아닐까. 불안한 시국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