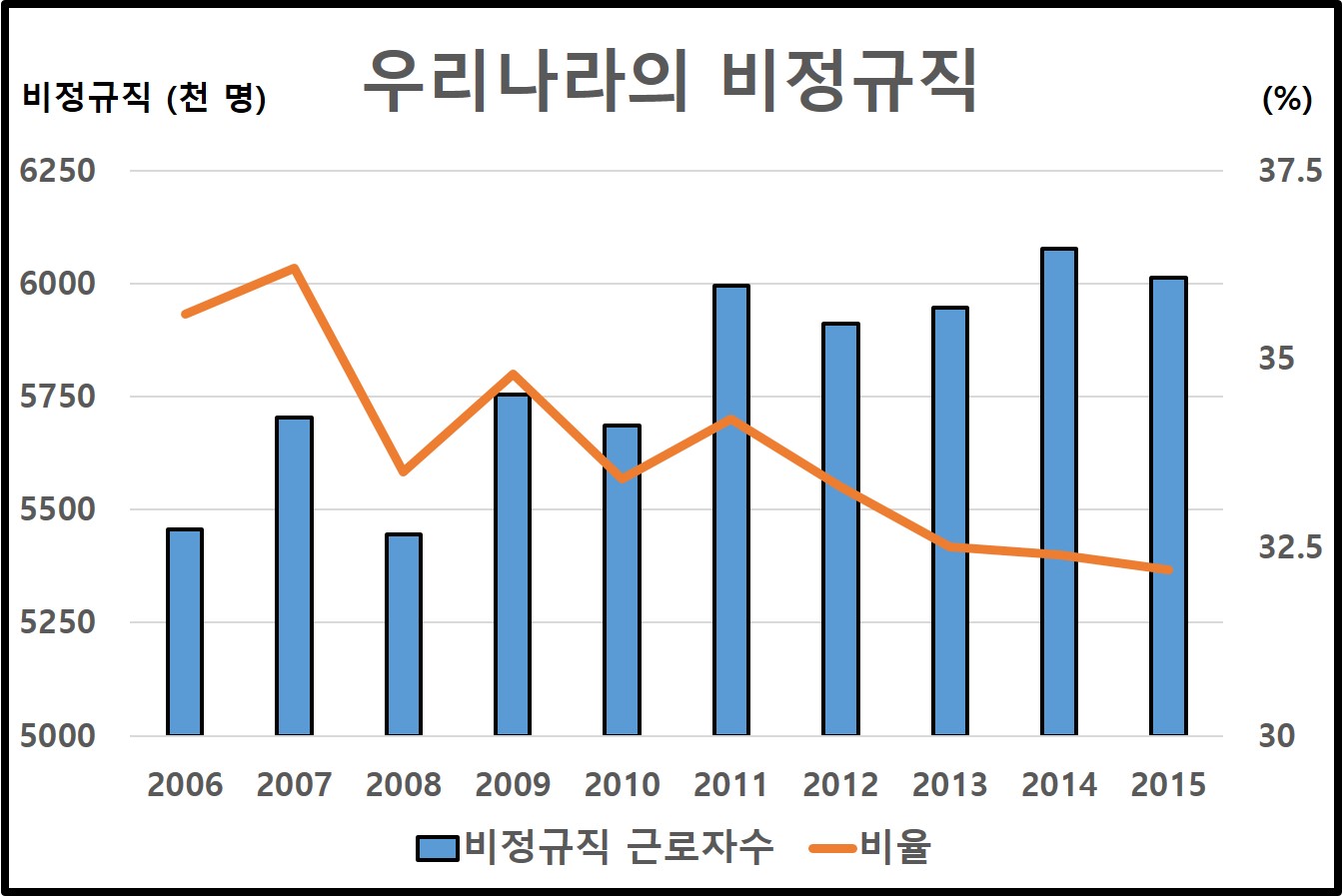
해외의 비정규직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전부터 종신고용제를 고수해온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많은 기업이 비용 감축에 돌입했다. 하지만 종신고용제와 연공 임금제로 인해 임금 삭감을 통한 노동 비용 문제 해결이 힘들었다. 결국,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뽑는 방법을 선택했고, 때문에 기간계약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1985년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15.4%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일본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4.4%가 되었고, 2013년 38.2%로 증가했다. 2010년 기준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9만 8,100엔으로 정규직 31만 1,500엔의 60% 정도이다.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경제는 소비침체와 고령화가 심해졌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1998년 계약기간의 기본적인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해 2년 또는 3년의 계약을 가능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8월 노동자 근로계약이 5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권고하는 등,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정규직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의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와 종업원 그리고 독립계약자로 분리하고, 종업원에게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노동자들도 종업원으로 인정되면 정규직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 노동자와 차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못한 상당수의 비정규노동자, 즉 독립계약자가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모든 노동관계법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과연 종업원인지를 법원에서조차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률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국 노동 시장에서 한국의 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해고의 자유도이다. 미국의 근로자는 별도의 노동 계약이 없는 경우 임의고용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 고용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 환경에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해고와 재고용의 자유도가 높은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빠른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한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부터 하락해, 2015년 1월 집계된 실업률은 5.7%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침체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통한 생산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미국과 같이 비정규직의 대우가 정규직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951년 만든 ‘동일 급여’ 선언을 유럽연합 인권 헌장과 노동법에 포함해 ‘유럽 연합 소속 국가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해 차별 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의 노동법은 노동 현장에서 능력, 성, 종교와 신념,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같은 임금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근로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싸고 편한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은 노동 환경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유럽이 노동법으로 ‘동일 급여’ 선언을 제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포항공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