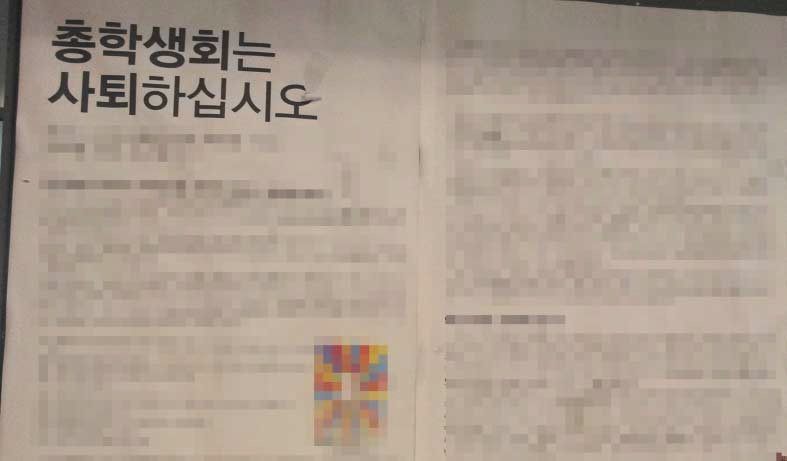лҢҖн•ҷ, к·ёл“Өмқҳ мҶҢлҰ¬к°Җ л“ӨлҰ¬мӢӯлӢҲк№Ң
“мқҙм ң лҢҖн•ҷкіј мһҗліёмқҳ мқҙ кұ°лҢҖн•ң нғ‘м—җм„ң лӮҙ лӘ«мқҳ лҸҢл©©мқҙ н•ҳлӮҳк°Җ л№ м§„лӢӨ. нғ‘мқҖ лҒ„л–Ўм—Ҷмқ„ кІғмқҙлӢӨ. н•ҳм§Җл§Ң лҢҖн•ҷмқ„ лІ„лҰ¬кі м§„м •н•ң лҢҖн•ҷмғқмқҳ мІ«л°ңмқ„ лӮҙл”ӣлҠ” н•ң мқёк°„мқҙ нғңм–ҙлӮңлӢӨ.”
мһ‘л…„ 3мӣ” м„ңмҡё мҶҢмһ¬ KлҢҖн•ҷкөҗ кІҪмҳҒн•ҷкіј 3н•ҷл…„ к№ҖмҳҲмҠ¬ м–‘мқҙ ‘мҳӨлҠҳ лӮҳлҠ” лҢҖн•ҷмқ„ к·ёл§Ңл‘”лӢӨ, м•„лӢҲ кұ°л¶Җн•ңлӢӨ.’лқјлҠ” м ңлӘ©мңјлЎң көҗлӮҙ кІҢмӢңнҢҗм—җ л¶ҷмқё 3мһҘмқҳ лҢҖмһҗліҙлҠ” мҡ°лҰ¬мӮ¬нҡҢм—җ нҒ° нҢҢмһҘмқ„ л¶Ҳлҹ¬мқјмңјмј°лӢӨ. мқҙ лҢҖмһҗліҙлҠ” лҢҖн•ҷмқҙ кёҖлЎңлІҢ мһҗліёкіј лҢҖкё°м—…м—җ к°ҖмһҘ нҡЁмңЁм ҒмңјлЎң ‘л¶Җн’Ҳ’мқ„ м ңкіөн•ҳлҠ” н•ҳмІӯ м—…мІҙк°Җ лҗҳм–ҙ лІ„л ёлӢӨлҠ” лӮҙмҡ©мңјлЎң, л§ҺмқҖ лҢҖн•ҷмғқкіј кё°м„ұм„ёлҢҖм—җкІҢ мҡ°лҰ¬мӮ¬нҡҢм—җ лҢҖн•ҙ лӢӨмӢң н•ң лІҲ мғқк°Ғн•ҙ ліҙкІҢ л§Ңл“Өм—ҲлӢӨ. мқҙмІҳлҹј лҢҖмһҗліҙлҠ” лҢҖн•ҷмғқл“Өлҝҗл§Ң м•„лӢҲлқј м „ көӯлҜјм—җкІҢк№Ңм§ҖлҸ„ нҒ° мҳҒн–Ҙмқ„ лҜём№ мҲҳ мһҲлҠ” нһҳмқ„ к°Җм§Җкі мһҲлӢӨ.

лҢҖмһҗліҙлҠ” мӢ лқјмӢңлҢҖ 진м„ұм—¬мҷ• л•Ңл¶Җн„° мӢңмһ‘лҗҳм–ҙ мЎ°м„ мӢңлҢҖлҘј кұ°міҗ нҳ„лҢҖк№Ңм§Җ мқҙм–ҙ진лӢӨ. мЎ°м„ мӢңлҢҖм—җлҠ” “мһ¬мЈјмҷҖ лҠҘл Ҙмқҙ мһҲм–ҙлҸ„ м ңлҢҖлЎң н•ҳлҠ” мқјмқҙ м—Ҷкі , мӢӨлҶҚн•ң мӮ¬лһҢл“ӨмқҖ мқјм–ҙлӮҳлқј. мһ¬мғҒмқҙ лҗ л§Ңн•ң мһҗ мһ¬мғҒмқ„ мӢңнӮӨкі , мһҘмҲҳк°Җ лҗ л§Ңн•ң мһҗ мһҘмҲҳлҘј мӢңнӮӨл©°, м§ҖлӘЁк°Җ мһҲлҠ” мһҗ м“°мһ„мқ„ м–»мқ„ кІғмқҙл©°, к°ҖлӮңн•ң мһҗ л¶Җмң н•ҙм§Ҳ кІғмқҙл©°, л‘җл ӨмӣҢн•ҳлҠ” мһҗ мҲЁкІЁмӨ„ кІғмқҙлӢӨ” лқјлҠ” лӮҙмҡ©мқҳ лҢҖмһҗліҙк°Җ л¶ҷм—ҲлӢӨ. мқҙ лӮҙмҡ©м—җм„ң м•Ң мҲҳ мһҲл“Ҝмқҙ кіјкұ°мқҳ лҢҖмһҗліҙлҸ„ мҡ”мҰҳ лҢҖн•ҷ кІҢмӢңнҢҗм—җ л¶ҷм–ҙ мһҲлҠ” лҢҖмһҗліҙмҷҖ лӢӨлҘј л°” м—Ҷмқҙ мӮ¬нҡҢ м§ҖлҸ„мёөмқ„ 비нҢҗн•ҳкі мӢңлҜјл“Өмқҳ кіөк°җмқ„ мң лҸ„н•ҳлҠ” лӮҙмҡ©мқҙ мЈјлҘј мқҙлЈЁм—ҲлӢӨ. мқҙл ҮкІҢ мҲҳл°ұ л…„ м „л¶Җн„° мӮ¬нҡҢм—җ нҒ° л°ҳн–Ҙмқ„ л¶Ҳлҹ¬мқјмңјнӮӨлҚҳ лҢҖмһҗліҙк°Җ 1980л…„ лҢҖм—җ мқҙлҘҙлҹ¬м„ңлҠ” лҢҖн•ҷм—җм„ң к·ё м—ӯн• мқ„ н•ҙлӮҳк°Җкё° мӢңмһ‘н–ҲлӢӨ.
| |  | |
|
мөңк·ј л¶ҖмӢӨлҢҖн•ҷ м„ м •мңјлЎң мқён•ҙ кұ°м„ј н•ӯмқҳмҡҙлҸҷмқҙ мқјм–ҙлӮ¬лҚҳ 추계мҳҲмҲ лҢҖн•ҷкөҗ м •л¬ём—җлҠ” ‘추계мҳҲмҲ лҢҖн•ҷкөҗ м „мІҙкөҗмҲҳ мқјлҸҷ’мқҙлқјлҠ” л¬ёкө¬лЎң мӢңмһ‘н•ҳлҠ” н•ң лҢҖмһҗліҙк°Җ м§ҖлӮҳк°ҖлҠ” мӮ¬лһҢл“Өмқҳ мӢңм„ мқ„ л¶ҷл“Өкі мһҲм—ҲлӢӨ. ‘м—¬лҹ¬л¶„мқ„ л¶ҖмӢӨлҢҖн•ҷмғқмңјлЎң л§Ңл“Өм–ҙм„ң лҜём•Ҳн•©лӢҲлӢӨ’лқјлҠ” л¬ёмһҘмқҖ н•„мӢң мһҗмӢ мқҳ мқјмқҙ м•„лӢҳм—җлҸ„ ліҙлҠ” мқҙмқҳ м•ҲнғҖк№ҢмӣҖмқҙ л°°м–ҙ лӮҳмҷҖм„ңмқј кІғмқҙлӢӨ.
м •л¬ё м•ҲмңјлЎң л“Өм–ҙм„ңмһҗ мқҙмұ„лЎңмҡҙ кҙ‘кІҪмқҙ лҲҲм—җ л“Өм–ҙмҳЁлӢӨ. мҳҲмҲ мқ„ м·Ём—…лҘ лЎң нҸүк°Җн•ңлӢӨл©ҙ мұ„н”ҢлҰ°, нҶЁмҠӨнҶ мқҙ, нҢҢл°”лЎңнӢ°, н”јм№ҙмҶҢ л“ұ к°Ғ мҳҲмҲ 분야мқҳ лҢҖк°Җл“ӨлҸ„ лӘЁл‘җ л¬ҙм§Ғмһҗм—җ л¶Ҳкіјн•ҳлӢӨлҠ” кё°л°ңн•ң нҸ¬мҠӨн„°лҘј мӢңмһ‘мңјлЎң “лӮҳ 4мҲҳн–ҲлҠ”лҚ° мһҘлӮңн•ҳлғҗ”, “мҷң л„Ҳк°Җ л¶ҖмӢӨн•ҷмғқмқҙлғҗ?!”, “мӮ¬нғңмқҳ мӢ¬к°Ғм„ұмқ„ мқём§Җн•ҳкі м Җн•ӯн•ҳлқј”, “мҲңмҲҳмҳҲмҲ м—җ мғҒмІҳлҘј мһ…нһҲлӢӨ” л“ұ мЈјл§җмқҙлқј көҗм •м—җ мӮ¬лһҢмқҖ м—Ҷм—Ҳм§Җл§Ң кіікіім—җм„ң 분노н•ң н•ҷмғқл“Өмқҳ лӘ©мҶҢлҰ¬к°Җ л“ӨлҰ¬лҠ” л“Ҝн–ҲлӢ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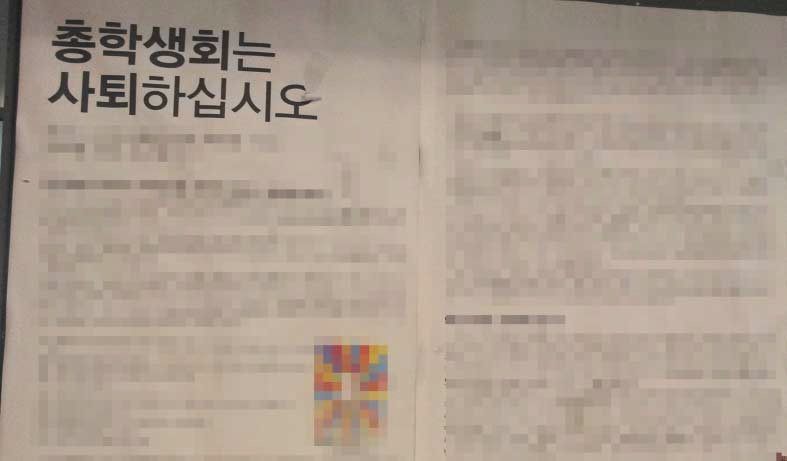 | |
|
мқјл°ҳм ҒмңјлЎң лҢҖн•ҷк°Җк°Җ к°Җ진 лҢҖн‘ңм Ғмқё л¬ём ңм җмқ„ кјҪмңјлқјл©ҙ м—ӯмӢң л“ұлЎқкёҲ л¬ём ңмқј кІғмқҙлӢӨ. кё°мһҗк°Җ лӢӨл…ҖмҳЁ лҢҖн•ҷ м–ҙлҠҗ кіімқҙлӮҳ ‘л°ҳк°’ л“ұлЎқкёҲ мӢӨнҳ„!’мқ„ лӘЁнҶ лЎң н•ң лҢҖмһҗліҙлҘј мүҪкІҢ ліј мҲҳ мһҲм—ҲлӢӨ. мқҙмҷём—җлҸ„ лҢҖн•ҷмғқ мһҗмӮҙ, лҢҖн•ҷ ліёл¶ҖгҶҚмҙқн•ҷмғқнҡҢ 비нҢҗ л“ұ лҢҖн•ҷмӮ¬нҡҢк°Җ м•„лӢҲл©ҙ лҢҖн•ҷ мһҗмІҙк°Җ м•Ҳкі мһҲлҠ” мқҙмҠҲм—җ лҢҖн•ң мғқк°Ғмқ„ лӢҙмқҖ лҢҖн•ҷмғқл“Өмқҳ лҢҖмһҗліҙк°Җ мә нҚјмҠӨлҘј мһҘмӢқн•ҳкі мһҲм—ҲлӢӨ.
| |  | |
|
мқјнҺёмқҳ мӢңк°Ғм—җм„ңлҠ” лҢҖмһҗліҙк°Җ лӢЁм§Җ н•ҷмғқл“Өмқҳ л¶Ҳл§Ңмқ„ нҶ лЎңн•ҳлҠ” ‘л°°м¶ңкө¬’лЎңл§Ң ліҙмқј м§ҖлҸ„ лӘЁлҘёлӢӨ. к·ёлҹ¬лӮҳ мҡ°лҰ¬ лҜјмЈјмӮ¬нҡҢм—җм„ң лҢҖмһҗліҙлҠ” лҢҖн•ҷмғқл“Өмқҙ мһҗмӢ мқҳ лӘ©мҶҢлҰ¬лҘј к°ҖмһҘ к°•н•ҳкІҢ лӮј мҲҳ мһҲлҠ” м°ём—¬мқҳ мғҒ징 мӨ‘ н•ҳлӮҳк°Җ м•„лӢҗк№Ң мӢ¶лӢӨ. лҢҖмһҗліҙлҠ” лҢҖн•ҷм—җ мһҗкё°л°ҳм„ұмқҳ кі„кё°лҘј л§Ңл“Өм–ҙмЈјкі л•ҢлЎңлҠ” м •л¶Җмқҳ м •мұ…мқ„ 비нҢҗн•ҳкі , мқҙлҘј н•ҷмғқл“Өмқҙ кіөк°җн•ҳкІҢ н•ҳлҠ” м—ӯн• мқ„ мҲҳн–үн•ҳлҠ” н•ҳлӮҳмқҳ лҢҖн•ҷ л¬ёнҷ”лЎң мһҗлҰ¬ мһЎм•ҳлӢӨ. лӮҳл¬ҙ мӮ¬мқҙ, кІҢмӢңнҢҗл§ҲлӢӨ кұёл Ө мһҲлҠ” лҢҖмһҗліҙмҷҖ нҳ„мҲҳл§үл“Өмқҙ мә нҚјмҠӨлҘј мҲҳлҶ“мқҖ кҙ‘кІҪмқҙ, мқҙм ң н•ҷмғқл“Өм—җкІҢлҠ” м–ҙмғүн•ҳм§Җ м•ҠмқҖ кҙ‘кІҪмқҙлӢӨ. мқҙм—җ 비н•ҙ мҡ°лҰ¬лҢҖн•ҷмқҖ к·ңм •лҗң н•ҷм№ҷм—җ л”°лқј н•ҷлӮҙ м •м№ҳнҷңлҸҷлҝҗл§Ң м•„лӢҲлқј көҗмҷём—җм„ңлҸ„ лҢҖн•ҷлӘ…мқҳмқҳ м •м№ҳм Ғ нҷңлҸҷмқ„ кёҲн•ҳкі мһҲлӢӨ. мқҙ л•Ңл¬ёмқём§Җ мҡ°лҰ¬лҢҖн•ҷм—җм„ң к°Ғмў… кіөм—°гҶҚн–үмӮ¬, лҸҷл¬ёнҡҢ, лҸҷм•„лҰ¬ нҷҚліҙ мҷём—җлҠ” лҢҖмһҗліҙлҘј м°ҫм•„ліҙкё° нһҳл“ӨлӢӨ.
мҡ°лҰ¬лҠ” н•ӯмғҒ ‘мҶҢнҶө’мқ„ мҷём№ңлӢӨ. мҶҢнҶөмқҙ лҗҳл Өл©ҙ мҡ°м„ н‘ңнҳ„мқ„ н•ҙм•ј н•ңлӢӨ. м§ҖкёҲмІҳлҹј н•ҷмғқл“Өмқҳ н‘ңнҳ„мқҙ нҷңл°ңн•ҳм§Җ лӘ»н•ң мғҒнҷ©м—җм„ң мҡ°лҰ¬лҠ” м–јл§ҲлӮҳ мҶҢнҶөмқ„ мһҳн• мҲҳ мһҲмқ„к№Ң. м–ём к°„ мҡ°лҰ¬лҢҖн•ҷм—җлҸ„ көҗлӮҙ кіікіім—җ н•ҷмғқл“Өмқҳ лӘ©мҶҢлҰ¬к°Җ мҡёл Ө нҚјм§ҖлҠ” лӮ мқ„ мғҒмғҒн•ҙліёлӢӨ.
м Җмһ‘к¶Ңмһҗ © нҸ¬н•ӯкіөлҢҖмӢ л¬ё л¬ҙлӢЁм „мһ¬ л°Ҹ мһ¬л°°нҸ¬ кёҲм§Җ